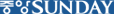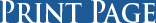|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월가의 주가가 열 달여 만에 최고점 대비 평균 47% 폭락한 현 상황을 두고 대공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공황의 정의(定義)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50년간의 모든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2008년은 80년 만에 또 하나의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작의 해가 될 것인가.
찰스 킨들버거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매니어-패닉-대파산-‘최후의 대부자’에 의한 정리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 구도에 비추어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 2단계를 지나 3단계와 4단계를 함께 겪고 있는 중이다. 주택가격과 금융자산이 상궤를 벗어나 폭등하면서 거품을 키운 것이 1단계다.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신용불안으로 돈줄이 막히는 패닉이 2단계다. 그에 따른 기업·금융기관과 개인의 연쇄 파산이 3단계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대한 구제금융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조치로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어 잘되면 1~2년 후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3단계가 얼마나 끌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숨겨진 부실의 ‘지뢰’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손실액 추정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투자은행과 거대 상업은행의 부실은 대충 드러났지만 ‘복마전’ 헤지펀드의 부실 드라마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과도한 레버리지 해소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개인 및 기업 파산,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다.
|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응은 ‘버냉키 효과’로 부를 만큼 일사불란하다. 그러나 불안 또한 없지 않다.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최후의 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이 끊어지면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대부자가 되고 있다. 또 개인 및 기업 부문 소비지출이 위축되면서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유일한 지출자가 되고 있다. 민간부문 손실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미국의 경우 앞으로 2년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로 전망돼 정부와 중앙은행의 장기 지급능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경기후퇴에 들어갔다면 후퇴는 1년째다. 29년 시작된 대공황은 후퇴 국면이 43개월 지속됐다. 대공황 때 뉴욕 증시의 주가(S&P 기준)는 29년 9월 3일을 정점으로 32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80% 폭락했다. 2008년의 경우 2007년 10월 9일을 정점으로 1년여 동안 50% 가까이 떨어져 하락 정도가 대공황 때보다 훨씬 급격하다. 인터넷에 의한 세계경제의 동시성과 상호연결성도 큰 몫을 했다. 주가 낙폭은 대공황의 경우 29년보다 31년(50%)이 최악이었다. 32년에 다시 10% 정도 더 하락하다 33년 60% 반등했다. 2008년이 29년이 아닌 31년에 해당했으면 하는 소망은 여기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