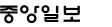NPO 홍보대사로 뛰는 두 국민배우…최불암&안성기
[중앙일보] 입력 2016.03.30 18:01 수정 2016.03.30 19:04
최불암(76)과 안성기(64)는 대표 '국민배우'라는 것 말고도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다. 최불암은 32년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다. 안성기는 23년 동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해왔다. 두 사람의 NPO 경력을 합하면 총 55년이다. 그들이 속한 단체는 공통적으로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는 곳이다.
두 배우가 지난 18일 만나 그동안의 봉사 활동에 얽힌 이야기를 나눴다. 1987년에 만들어진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연기했던 두 배우는 이후 간간이 시상식 등의 행사에서 마주치기는 했지만 긴 대화를 한 적은 없었다.
인사를 나눈 뒤 잠시 머쓱해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활동에 대한 얘기로 접어들자 이심전심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최불암(이하 최)="오랜만이네, 안선생.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지?"
안성기(이하 안)="네, 선배님. 그런데 왠지 꼭 자주 뵌 것 같네요. 활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가…."
최="나도 마찬가지야. 비행기 탈 때마다 유니세프 홍보 영상이 나와서 '이 친구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었어. 그나저나 요새는 무슨 일을 하나?"
안="2월에 동티모르에 다녀왔어요. 저희가 거기서 '아동 친화 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말고도 후원자들과의 토크콘서트, 홍보영상 내레이션 작업 등을 했죠."
최="난 지난해에 케냐에 갔다왔어. 이 나이에 스물네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니까 아주 죽겠더만. 케냐는 몇 년째 가뭄이 극심해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있더라고. 가슴이 아팠어. 올해도 국내외로 열심히 돌아다닐 계획이야."
안="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저지만 선배님은 정말 오래 되셨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최="난 드라마 '전원일기' 덕분에 어린이재단에 처음 들어갔어. 1981년도였나? 드라마에서 내가 업둥이로 금동이를 데리고 온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나한테 시청자 팬레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다 작가의 펜 끝에서 나온 얘긴데 시청자들이 그런 걸 구분 못할 때였거든."
안="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네요."
최="정말 그랬어. 내 고민을 알게 된 지인이 '그럼 진짜 어린이들을 도와 보라'고 하더군. 그때 어린이재단을 처음 알았고 재단에서 서울시 후원회장직을 내게 제안했지.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네."
안="선배님이 모든 연예인 홍보대사의 원조네요.(웃음)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유니세프 로고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최="안 선생도 수혜를 좀 받았나?"
안="그럼요. 밀가루·분유·헌옷…. 그러다 80년대 후반에 제가 배우 활동을 할 때 불우이웃돕기 단체 행사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믿을만한 단체가 거의 없었죠."
최="맞아, 그때 단체들이 참 많았지"
안="네 비슷한 시기에 유니세프에서도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유니세프가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뀔 때쯤인 1993년이었어요. 옛날에 도움 받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겠다 싶었죠."
최="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내가 말이지, 1984년도에 어린이재단 본부가 있는 미국 리치몬드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한 미국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 아이가 뇌전증 증세가 있어 일주일에 두세 번 발작을 하는데 정말 극진히 돌보더라고. 내가 물었지. '당신들의 정신은 신앙에서 오는 겁니까, 교육에서 오는 겁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어. '이 아이를 만나게 해준 당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일을 못 끊어."
안="전 지금까지 소말리아·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동티모르까지 15개 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은 다 똑같이 천진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 눈망울이 정말…."
최="그래, 정서를 적셔주지."
안="갔다오면 그 눈망울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끊질 못하겠어요. 우리가 도우러 가는 건데 되려 더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오곤 해요.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최="내가 케냐에 갔다고 했잖아?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무슨 용기로 노구를 끌고 아프리카에 온 건가' 싶었어. 갔더니 큰 강줄기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들이 한 7~8m 파니까 물이 조금 고이는데 허연 물도 아니고 벌건 진흙물이야. 그걸 겨우 사람들이 나눠마셔. 아이들은 내가 들고 다니는 생수통을 보며 '그게 진짜 마시는 물이냐'고 묻더라. 그런 물을 본 적이 없는 거지. 죄스럽고 목이 메었어. 그때 하늘을 쳐다봤어. 신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생각하면서."
안="저도 에티오피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열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커다란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누런 물이 고여있는. 그런데 꼬마들이 전부 양동이를 이고 그 물을 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니 웅덩이에서 세 시간 떨어진 곳에서 왔대요. 그대로 또 세 시간 걸려 집에 돌아가는 게 이 아이들의 일상이에요. NPO 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잖아. 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야. 요새는 전파 매체가 발달하면서 재해·전쟁 등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잘못 같아."
안="좋은 말씀입니다. 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이 여러 국제 구호단체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소 팔고 논 팔아 자식들 교육시킨 부모들 덕분이잖아요."
최="나도 안 선생 생각에 정말 공감해. 삶의 지혜란 결국 제대로 된 교육에서 오는 거니까. 대중과 친숙한 우리같은 문화예술인이 더욱 앞장서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겠지."
안="그래서 요새 후배들이 NPO 홍보대사도 많이 하잖아요. 혹자는 '보여주기'식이라면서 비판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인기를 노리고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이 일 오래 못하죠.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최="맞는 말이야. 홍보대사 활동하는 친구들은 내게 다 예뻐 보여. 그 뜻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안="이렇게 선배님과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봉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이 살기 위한 '서비스'지. 기아·질병·전쟁 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하면 그게 결국 우리도 사는 길 아닐까? 그렇게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야."
안="네. 말로 표현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것도 나눠서 하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누는 거죠."
최="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네.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에 북한 아이들을 꼭 돕고 싶어. 남북관계 좋을 때는 재단서 빵 공장 지어 아이들에게 빵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안 선생은 어떤가?"
안="전 넓게 보다는 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표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아이들과 만나고 소통해 나가는 일을 더 열심히 해 나가고 싶어요."
최="이하 동문일세."
두 배우가 지난 18일 만나 그동안의 봉사 활동에 얽힌 이야기를 나눴다. 1987년에 만들어진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연기했던 두 배우는 이후 간간이 시상식 등의 행사에서 마주치기는 했지만 긴 대화를 한 적은 없었다.
인사를 나눈 뒤 잠시 머쓱해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활동에 대한 얘기로 접어들자 이심전심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배우 최불암과 안성기가 지난 18일 소속 단체의 셔츠를 입고 중앙일보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아래는 2007년에 우간다 난민촌에서 어린이에게 비타민제를 먹이는 안성기와 지난해 케냐를 방문했을 때 현지 어린이를 안아 주는 최불암의 모습. 김현동 기자, [사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배우 최불암과 안성기가 지난 18일 소속 단체의 셔츠를 입고 중앙일보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아래는 2007년에 우간다 난민촌에서 어린이에게 비타민제를 먹이는 안성기와 지난해 케냐를 방문했을 때 현지 어린이를 안아 주는 최불암의 모습. 김현동 기자, [사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배우 최불암과 안성기가 지난 18일 소속 단체의 셔츠를 입고 중앙일보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아래는 2007년에 우간다 난민촌에서 어린이에게 비타민제를 먹이는 안성기와 지난해 케냐를 방문했을 때 현지 어린이를 안아 주는 최불암의 모습. 김현동 기자, [사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불암(이하 최)="오랜만이네, 안선생.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지?"
안성기(이하 안)="네, 선배님. 그런데 왠지 꼭 자주 뵌 것 같네요. 활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가…."
최="나도 마찬가지야. 비행기 탈 때마다 유니세프 홍보 영상이 나와서 '이 친구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었어. 그나저나 요새는 무슨 일을 하나?"
안="2월에 동티모르에 다녀왔어요. 저희가 거기서 '아동 친화 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말고도 후원자들과의 토크콘서트, 홍보영상 내레이션 작업 등을 했죠."
최="난 지난해에 케냐에 갔다왔어. 이 나이에 스물네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니까 아주 죽겠더만. 케냐는 몇 년째 가뭄이 극심해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있더라고. 가슴이 아팠어. 올해도 국내외로 열심히 돌아다닐 계획이야."
안="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저지만 선배님은 정말 오래 되셨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최="난 드라마 '전원일기' 덕분에 어린이재단에 처음 들어갔어. 1981년도였나? 드라마에서 내가 업둥이로 금동이를 데리고 온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나한테 시청자 팬레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다 작가의 펜 끝에서 나온 얘긴데 시청자들이 그런 걸 구분 못할 때였거든."
안="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네요."
최="정말 그랬어. 내 고민을 알게 된 지인이 '그럼 진짜 어린이들을 도와 보라'고 하더군. 그때 어린이재단을 처음 알았고 재단에서 서울시 후원회장직을 내게 제안했지.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네."
안="선배님이 모든 연예인 홍보대사의 원조네요.(웃음)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유니세프 로고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최="안 선생도 수혜를 좀 받았나?"
안="그럼요. 밀가루·분유·헌옷…. 그러다 80년대 후반에 제가 배우 활동을 할 때 불우이웃돕기 단체 행사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믿을만한 단체가 거의 없었죠."
최="맞아, 그때 단체들이 참 많았지"
안="네 비슷한 시기에 유니세프에서도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유니세프가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뀔 때쯤인 1993년이었어요. 옛날에 도움 받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겠다 싶었죠."
최="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내가 말이지, 1984년도에 어린이재단 본부가 있는 미국 리치몬드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한 미국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어. 아이가 뇌전증 증세가 있어 일주일에 두세 번 발작을 하는데 정말 극진히 돌보더라고. 내가 물었지. '당신들의 정신은 신앙에서 오는 겁니까, 교육에서 오는 겁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어. '이 아이를 만나게 해준 당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일을 못 끊어."
안="전 지금까지 소말리아·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동티모르까지 15개 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은 다 똑같이 천진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 눈망울이 정말…."
최="그래, 정서를 적셔주지."
안="갔다오면 그 눈망울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끊질 못하겠어요. 우리가 도우러 가는 건데 되려 더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오곤 해요.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최="내가 케냐에 갔다고 했잖아?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무슨 용기로 노구를 끌고 아프리카에 온 건가' 싶었어. 갔더니 큰 강줄기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들이 한 7~8m 파니까 물이 조금 고이는데 허연 물도 아니고 벌건 진흙물이야. 그걸 겨우 사람들이 나눠마셔. 아이들은 내가 들고 다니는 생수통을 보며 '그게 진짜 마시는 물이냐'고 묻더라. 그런 물을 본 적이 없는 거지. 죄스럽고 목이 메었어. 그때 하늘을 쳐다봤어. 신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생각하면서."
안="저도 에티오피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열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커다란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누런 물이 고여있는. 그런데 꼬마들이 전부 양동이를 이고 그 물을 떠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니 웅덩이에서 세 시간 떨어진 곳에서 왔대요. 그대로 또 세 시간 걸려 집에 돌아가는 게 이 아이들의 일상이에요. NPO 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잖아. 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야. 요새는 전파 매체가 발달하면서 재해·전쟁 등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잘못 같아."
안="좋은 말씀입니다. 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이 여러 국제 구호단체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소 팔고 논 팔아 자식들 교육시킨 부모들 덕분이잖아요."
최="나도 안 선생 생각에 정말 공감해. 삶의 지혜란 결국 제대로 된 교육에서 오는 거니까. 대중과 친숙한 우리같은 문화예술인이 더욱 앞장서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겠지."
안="그래서 요새 후배들이 NPO 홍보대사도 많이 하잖아요. 혹자는 '보여주기'식이라면서 비판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인기를 노리고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이 일 오래 못하죠. 표정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최="맞는 말이야. 홍보대사 활동하는 친구들은 내게 다 예뻐 보여. 그 뜻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안="이렇게 선배님과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봉사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이 살기 위한 '서비스'지. 기아·질병·전쟁 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하면 그게 결국 우리도 사는 길 아닐까? 그렇게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야."
안="네. 말로 표현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것도 나눠서 하고 좋은 것도 함께 나누는 거죠."
최="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네.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에 북한 아이들을 꼭 돕고 싶어. 남북관계 좋을 때는 재단서 빵 공장 지어 아이들에게 빵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안 선생은 어떤가?"
안="전 넓게 보다는 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표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아이들과 만나고 소통해 나가는 일을 더 열심히 해 나가고 싶어요."
최="이하 동문일세."
'내가 보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일보] 중년의 취미활동 (0) | 2016.04.24 |
|---|---|
| [중앙일보] 미국인과 한국인의 심리적 차이 (0) | 2016.04.24 |
| [중앙일보] 도서 베스트 셀러 (0) | 2016.04.10 |
| [중앙일보]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DIY-누구나 생산자 (0) | 2016.04.10 |
| [중앙일보] 취업과 창업 (0) | 201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