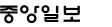[사설] 생활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
[중앙일보] 입력 2016.05.05 19:21 수정 2016.05.05 23:52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폐 손상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생활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과학적으로 볼 때 ‘살생물제(Biocide)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해당한다. 살생물제는 생활환경에서 인간이 원치 않는 미생물·곤충 등을 제거하는 생활화학물질이다. 위생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선 필수품이다. 생활화학물질의 30% 정도를 살생물제가 차지하는 이유다.
살생물제는 저농도로 사용되지만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데다 노출 빈도가 잦다. 이에 따라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용 유독물질 못지않게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물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위생적으로 생활하려고 사용한 가습기소독제가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도 이런 허술한 관리에서 벌어진 인재였다고 볼 수 있다. 바닥 청소에 쓰는 살생물제를 안전성 확인도 없이 가습기소독제로 전용하다 폐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생물제를 비롯한 생활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위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물질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생활화학물질 안전을 확보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국내에 살생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제도적 생활화학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일찌감치 간파해 1998년 2월 ‘살생물제 관리지침’을 도입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모든 살생물질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2013년부터는 살생물제관리법을 발효해 발암성·생식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 인체나 환경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생산과 유통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내용만 입법예고됐을 뿐이다. 살생물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일부 살생물제만 제한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이 생활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살생물제관리법’이 절실하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부터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살생물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 주는 일이기도 하다.
전수조사로 안전성 재검증해야
안전 확인 안 되면 시장서 퇴출
관리법 만들어 비극 재발 막아야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생물제를 비롯한 생활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위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물질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생활화학물질 안전을 확보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국내에 살생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적·제도적 생활화학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일찌감치 간파해 1998년 2월 ‘살생물제 관리지침’을 도입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모든 살생물질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2013년부터는 살생물제관리법을 발효해 발암성·생식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 인체나 환경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생산과 유통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내용만 입법예고됐을 뿐이다. 살생물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일부 살생물제만 제한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이 생활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살생물제관리법’이 절실하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살생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부터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살생물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 주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보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0) | 2016.05.23 |
|---|---|
| [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0) | 2016.05.23 |
| [중앙일보] 훼손된 지구 (0) | 2016.05.10 |
| [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0) | 2016.05.10 |
| [중앙일보]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직업 (0) | 201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