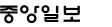그 길 속 그 이야기 <69> 부산 초량이바구길
[중앙일보] 입력 2016.01.15 00:01 수정 2016.01.15 09:39
l 물지게 졌던 168개 계단,
좁은 골목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

부산은 바다다. 최초 개항(1876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오를 필요도 없다. 여름마다 해운대 백사장에 모이는 100만 인파만 생각해도, 부산은 바다다. 아니다. 부산은 산이다.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810m)을 오른 적 없어도 부산은 산이다. 부산(釜山)은 제 이름에 산을 둔 고장이다. 알고 보면 부산은 바다도 아니고, 산도 아니다. 부산은 계단이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산이 에워싼 이 막다른 터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애오라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깎아 길을 내고 비탈에 기대 계단을 쌓았다. 그 계단을 따라서 부산의 고달픈, 그러나 도저한 삶이 이어졌다. 하여 부산은 계단이다.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었다. 그 짧은 길을 걸으면서 몇 번을 주저앉았다. 우리네 지난날이 길바닥에 흉터처럼 배어 있었다.
길은 이야기다
부산에는 이름에 ‘이야기’가 들어간 길이 있다. 이름하여 이바구길. ‘이바구’가 이야기의 경상도 방언이다. 길이 난 지역을 이름 앞에 붙여 ‘초량 이바구길’이라고도 한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이야깃거리 많은 길이란 뜻이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 동구청이 2013년 조성했다. 2.7㎞ 길이의 짧은 길이다.
사실 세상의 모든 길은 이야기다. 사람이 길을 내고 길을 걷는 행위가 종국에는 이야기로 환원된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이야기가 뿌려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야기가 묻어간다. 길의 속성이 본래 그러한데, 초량 이바구길은 제 이름에 떡 하니 이야기를 갖다 붙였다.
부산 지도를 보면 연유를 알 수 있다. 초량동 시내에서 큰길(중앙대로) 하나만 건너면 부산역이다. 부산역 뒤로는 부산항이 이어진다. 부산과 내륙, 부산과 바다를 잇는 기점이 모두 초량동 골목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다. 하여 초량동은 주변의 수정동·중앙동·광복동·남포동·보수동·범일동 등과 함께 ‘원도심’이라 불린다.
부산 원래의 도심이었으니, 마을마다 원래 부산의 이야기가 쟁여있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다. 이 마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한국 근현대사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어지러웠던 구한말부터 분했던 일제강점기까지, 혼란스러웠던 한국전쟁부터 먹고살 길 막막했던 근대화 시기까지 우리네 서러운 이야기가 골목 모퉁이마다 배어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초량 이바구길은 차이나타운을 알리는 상해문에서 시작한다. 빨간색 간판이 요란한 차이나타운을 지나면 영어 간판이 즐비한 옛 텍사스촌 골목이 이어지고(미군이 총잡이처럼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해서 미군을 상대로 했던 전국의 유흥가는 똑같이 텍사스촌으로 불렸다), 텍사스촌 골목을 돌아나오면 붉은 벽돌 쌓아올린 옛 일본식 건물(옛 백제병원과 남선창고 터)이 눈앞에 나타난다.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우리네 이야기였던 삶의 흔적이다.
비좁은 골목을 지나면 길은 초량초등학교 정문 앞에 다다른다. 학교 담장에 옛 부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경규·나훈아·박칼린·이윤택 같은 낯익은 이름도 적혀 있다. 다들 이 학교 출신이란다. 학교 담장이 끝나는 자리에서 ‘168 도시락’ 간판이 보인다. 168계단 앞에 있는 도시락 집으로 65∼82세의 동네 할머니 14명이 번갈아가며 나와서 손님을 맞는다. 설선자 할머니(78)가 점심상을 차려줬다. 흰밥과 볶은 김치, 계란프라이가 양철도시락 안에 담긴 옛날 ‘벤또(사진)’였다.
초량 이바구길에는 부산말로 ‘할배’와 ‘할매’가 유난히 많다. 부산관광공사는 원도심 5곳에 길을 내면서 스토리텔러 79명을 배치했는데 그들이 모두 지역 출신의 어르신이다. ‘이야기 할배’‘이야기 할매’로 불린다.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 콘텐트를 결합한 사업”이라며 “2014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1만 명이 할매 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걸었다”고 소개했다.
부산은 계단이다
이윽고 168계단 앞에 섰다. 계단 아래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이 계단을 일일이 다 셌을까?” 의문은 계단에 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풀렸다. 김영숙(68) 이야기 할매의 설명을 옮긴다.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에 엄청난 사람이 모였잖아. 피란민이 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산으로 올라갔고. 이 계단 위 산 중턱에도 마을이 생겼지. 그런데 산 위에는 물이 없었어. 물을 받으려면 계단 아래 우물까지 내려와야 했어. 계단 윗동네 사람들은 물지게를 지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던 거야. 애들도 작은 항아리를 안고 계단을 올랐어. 한 번 물을 받으려면 서너 시간씩 기다리고 했다네. 그래도 물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씻은 물로 어머니가 씻고 어머니가 씻은 물로 아이들이 씻고 그 물로 빨래까지 했어.”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에 엄청난 사람이 모였잖아. 피란민이 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산으로 올라갔고. 이 계단 위 산 중턱에도 마을이 생겼지. 그런데 산 위에는 물이 없었어. 물을 받으려면 계단 아래 우물까지 내려와야 했어. 계단 윗동네 사람들은 물지게를 지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던 거야. 애들도 작은 항아리를 안고 계단을 올랐어. 한 번 물을 받으려면 서너 시간씩 기다리고 했다네. 그래도 물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씻은 물로 어머니가 씻고 어머니가 씻은 물로 아이들이 씻고 그 물로 빨래까지 했어.”
옛날에는 계단 아래에 우물이 3개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었다. 자료를 뒤져보니 1981년이 돼서야 계단 윗동네에도 수돗물이 나왔다. 30년 동안 물지게를 지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다는 얘기다. 계단 아래에서는 계단 위가 잘 안 보인다. 그만큼 경사가 급하다. 60도는 족히 넘어 보였다. 이 위태위태한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릴 때 산동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하나 계단을 세면서 스스로 위안하지 않았을까.
168계단은 산동네 주민에게 물을 얻는 활로였지만 일거리를 찾아 뛰어내렸던 출근길이기도 했다. 168개 계단을 다 올라서 돌아보면 부산역과 부산항이 바로 내려다보인다. 변변한 일거리가 없던 시절 산동네 사람은 부산역에 기차가 도착하거나 부산항에 배가 정박하면 부리나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남보다 먼저 도착해야 기차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마침 서병수 부산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도 기꺼이 물지게를 지고 계단을 올랐다. 처음에는 걸음에서 여유가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힘겨운 기색이 역력했다. “부산을 상징하는 장소는 의외로 계단이에요. 이 가파른 계단에 부산사람의 삶이 다 들어 있어요. 부산에서는 ‘가이당(かいだん)’이라고 하지.”
168계단 옆에는 현재 모노레일 공사가 한창이다. 올 봄에는 개통할 계획이라는데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168개 계단을 하나씩 다 밟으면 이른바 산복도로에 이른다. 이정표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의 망양로(望洋路)라고 적혀 있다. 이름처럼 길에 올라서면 부산 앞바다가 훤히 보인다. 부산에서는 산복도로(山腹道路)가 더 익숙한 이름이다. 산 중턱을 지나는 길이라는 뜻이다. 산에도 사람이 들자 산의 배를 갈라 길을 낸 것이다. 산복도로를 상징하는 장면이 있다. 길 아래 비탈에 집이 있는데 너무 가팔라 차를 댈 수 없자 옥상에 주차장을 들였다. 산복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이고 산다.
초량 이바구길은 산복도로를 따라 이어지다 ‘까꼬막’에서 끝이 난다. ‘까꼬막’은 가파른 언덕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다. 이 가파른 언덕에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카페도 있다. 간판에 ‘천지 빼까리 까꼬막 카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영숙 할매가 뜻을 알려줬다. “천지빼까리 집이 있는기라. 봐라. 이 까꼬막에도 천지빼까리 다 있지 않나. 이게 부산인기라.”
 ●길 정보= 지도에는 초량 이바구길이 1.5㎞ 길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측정한 거리는 2.7㎞였다. 이야기 할매·할배와 동행하려면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bto.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무료. 168계단 아래에 ‘168 도시락(추억의 도시락 4000원)’이 있고, 계단 위에 ‘625 막걸리(막걸리 2500원, 해물파전 5000원)’가 있다. ‘625 막걸리’ 바로 옆에는 게스트하우스 ‘이바구 충전소(1인 1만5000원)’도 있다. 세 곳 모두 지역 어르신이 일을 한다. 전화번호도 같다. 051-567-7887. 산복도로 어귀에 자료관 ‘이바구 공작소’가 있다. 옛날 교복 체험(1000원)도 할 수 있다.
●길 정보= 지도에는 초량 이바구길이 1.5㎞ 길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측정한 거리는 2.7㎞였다. 이야기 할매·할배와 동행하려면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bto.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무료. 168계단 아래에 ‘168 도시락(추억의 도시락 4000원)’이 있고, 계단 위에 ‘625 막걸리(막걸리 2500원, 해물파전 5000원)’가 있다. ‘625 막걸리’ 바로 옆에는 게스트하우스 ‘이바구 충전소(1인 1만5000원)’도 있다. 세 곳 모두 지역 어르신이 일을 한다. 전화번호도 같다. 051-567-7887. 산복도로 어귀에 자료관 ‘이바구 공작소’가 있다. 옛날 교복 체험(1000원)도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이 달의 추천길 <1월> ‘부산’
부산 대표 트레일 10곳
글·사진=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좁은 골목마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

부산 초량동에는 168개 계단으로 이어진 길이 있다. 이 계단을 따라 피란민의 고단한 삶도 이어졌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옛 피란 시절을 떠올리며 물지게를 지고 계단을 올랐다.
부산은 바다다. 최초 개항(1876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오를 필요도 없다. 여름마다 해운대 백사장에 모이는 100만 인파만 생각해도, 부산은 바다다. 아니다. 부산은 산이다.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810m)을 오른 적 없어도 부산은 산이다. 부산(釜山)은 제 이름에 산을 둔 고장이다. 알고 보면 부산은 바다도 아니고, 산도 아니다. 부산은 계단이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산이 에워싼 이 막다른 터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애오라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깎아 길을 내고 비탈에 기대 계단을 쌓았다. 그 계단을 따라서 부산의 고달픈, 그러나 도저한 삶이 이어졌다. 하여 부산은 계단이다. ‘초량 이바구길’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었다. 그 짧은 길을 걸으면서 몇 번을 주저앉았다. 우리네 지난날이 길바닥에 흉터처럼 배어 있었다.
길은 이야기다
부산에는 이름에 ‘이야기’가 들어간 길이 있다. 이름하여 이바구길. ‘이바구’가 이야기의 경상도 방언이다. 길이 난 지역을 이름 앞에 붙여 ‘초량 이바구길’이라고도 한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이야깃거리 많은 길이란 뜻이다. 부산관광공사와 부산 동구청이 2013년 조성했다. 2.7㎞ 길이의 짧은 길이다.
사실 세상의 모든 길은 이야기다. 사람이 길을 내고 길을 걷는 행위가 종국에는 이야기로 환원된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이야기가 뿌려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야기가 묻어간다. 길의 속성이 본래 그러한데, 초량 이바구길은 제 이름에 떡 하니 이야기를 갖다 붙였다.
부산 지도를 보면 연유를 알 수 있다. 초량동 시내에서 큰길(중앙대로) 하나만 건너면 부산역이다. 부산역 뒤로는 부산항이 이어진다. 부산과 내륙, 부산과 바다를 잇는 기점이 모두 초량동 골목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다. 하여 초량동은 주변의 수정동·중앙동·광복동·남포동·보수동·범일동 등과 함께 ‘원도심’이라 불린다.
부산 원래의 도심이었으니, 마을마다 원래 부산의 이야기가 쟁여있는 건 당연하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다. 이 마을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한국 근현대사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어지러웠던 구한말부터 분했던 일제강점기까지, 혼란스러웠던 한국전쟁부터 먹고살 길 막막했던 근대화 시기까지 우리네 서러운 이야기가 골목 모퉁이마다 배어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초량 이바구길은 차이나타운을 알리는 상해문에서 시작한다. 빨간색 간판이 요란한 차이나타운을 지나면 영어 간판이 즐비한 옛 텍사스촌 골목이 이어지고(미군이 총잡이처럼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해서 미군을 상대로 했던 전국의 유흥가는 똑같이 텍사스촌으로 불렸다), 텍사스촌 골목을 돌아나오면 붉은 벽돌 쌓아올린 옛 일본식 건물(옛 백제병원과 남선창고 터)이 눈앞에 나타난다.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우리네 이야기였던 삶의 흔적이다.
비좁은 골목을 지나면 길은 초량초등학교 정문 앞에 다다른다. 학교 담장에 옛 부산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경규·나훈아·박칼린·이윤택 같은 낯익은 이름도 적혀 있다. 다들 이 학교 출신이란다. 학교 담장이 끝나는 자리에서 ‘168 도시락’ 간판이 보인다. 168계단 앞에 있는 도시락 집으로 65∼82세의 동네 할머니 14명이 번갈아가며 나와서 손님을 맞는다. 설선자 할머니(78)가 점심상을 차려줬다. 흰밥과 볶은 김치, 계란프라이가 양철도시락 안에 담긴 옛날 ‘벤또(사진)’였다.
초량 이바구길에는 부산말로 ‘할배’와 ‘할매’가 유난히 많다. 부산관광공사는 원도심 5곳에 길을 내면서 스토리텔러 79명을 배치했는데 그들이 모두 지역 출신의 어르신이다. ‘이야기 할배’‘이야기 할매’로 불린다. 심정보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 콘텐트를 결합한 사업”이라며 “2014년 6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1만 명이 할매 할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걸었다”고 소개했다.
부산은 계단이다
이윽고 168계단 앞에 섰다. 계단 아래에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누가 이 계단을 일일이 다 셌을까?” 의문은 계단에 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풀렸다. 김영숙(68) 이야기 할매의 설명을 옮긴다.

옛날에는 계단 아래에 우물이 3개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었다. 자료를 뒤져보니 1981년이 돼서야 계단 윗동네에도 수돗물이 나왔다. 30년 동안 물지게를 지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다는 얘기다. 계단 아래에서는 계단 위가 잘 안 보인다. 그만큼 경사가 급하다. 60도는 족히 넘어 보였다. 이 위태위태한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릴 때 산동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하나 계단을 세면서 스스로 위안하지 않았을까.
168계단은 산동네 주민에게 물을 얻는 활로였지만 일거리를 찾아 뛰어내렸던 출근길이기도 했다. 168개 계단을 다 올라서 돌아보면 부산역과 부산항이 바로 내려다보인다. 변변한 일거리가 없던 시절 산동네 사람은 부산역에 기차가 도착하거나 부산항에 배가 정박하면 부리나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남보다 먼저 도착해야 기차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마침 서병수 부산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도 기꺼이 물지게를 지고 계단을 올랐다. 처음에는 걸음에서 여유가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힘겨운 기색이 역력했다. “부산을 상징하는 장소는 의외로 계단이에요. 이 가파른 계단에 부산사람의 삶이 다 들어 있어요. 부산에서는 ‘가이당(かいだん)’이라고 하지.”
168계단 옆에는 현재 모노레일 공사가 한창이다. 올 봄에는 개통할 계획이라는데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168개 계단을 하나씩 다 밟으면 이른바 산복도로에 이른다. 이정표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의 망양로(望洋路)라고 적혀 있다. 이름처럼 길에 올라서면 부산 앞바다가 훤히 보인다. 부산에서는 산복도로(山腹道路)가 더 익숙한 이름이다. 산 중턱을 지나는 길이라는 뜻이다. 산에도 사람이 들자 산의 배를 갈라 길을 낸 것이다. 산복도로를 상징하는 장면이 있다. 길 아래 비탈에 집이 있는데 너무 가팔라 차를 댈 수 없자 옥상에 주차장을 들였다. 산복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이고 산다.
초량 이바구길은 산복도로를 따라 이어지다 ‘까꼬막’에서 끝이 난다. ‘까꼬막’은 가파른 언덕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이다. 이 가파른 언덕에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카페도 있다. 간판에 ‘천지 빼까리 까꼬막 카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영숙 할매가 뜻을 알려줬다. “천지빼까리 집이 있는기라. 봐라. 이 까꼬막에도 천지빼까리 다 있지 않나. 이게 부산인기라.”

[관련 기사] │ 이 달의 추천길 <1월> ‘부산’
부산 대표 트레일 10곳
글·사진=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내가 보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일보] 사물인터넷의 응용 (0) | 2016.01.24 |
|---|---|
| [중앙일보] 부산의 걷기 여행길 (0) | 2016.01.24 |
| [동아일보] 美서 이공계 박사 학위 한국인 60% "미국에 남겠다" (0) | 2016.01.16 |
| [중앙일보] 의미 수난시대 (0) | 2016.01.11 |
| [사이언스타임즈] 2016년 떠오를 과학이슈 10선 (0) | 201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