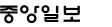[The New York Times] 아직도 먼 100% 자율주행 차량의 꿈
[중앙일보] 입력 2016.07.19 00:30 수정 2016.07.19 11:19
자율주행차 첫 사망자 내
업체들 장밋빛 홍보 불구
기술 수준 턱없이 부족해
구글조차 ‘30년 뒤나 가능’

리 고메스
과학기술 저널리스트
브라운은 사고 당시 테슬라가 요구한 자동주행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보인다. 차가 자동주행 중이라도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아야 하며 언제라도 즉각 운전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브라운은 이를 어긴 대신 테슬라모터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일론 머스크의 말을 더 귀담아들은 걸로 보인다.
머스크는 ‘영업의 귀재’로 유명하다. 그는 자동주행 기능을 홍보하면서 그런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 “자동주행차는 사람보다 두 배는 더 훌륭하다”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 1300㎞ 거리를 운전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얘기를 “과장됐다”고 비난하며 자율주행차 전체를 매도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자율주행차 내러티브와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차 운전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만큼 자율주행 차량의 보편적 보급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주장 말이다. “언제?”라고 물으면 실리콘밸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라고 대답한다. 이런 세상에선 대중교통이 불필요해지니 그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최근 볼보가 발표한 ‘드라이브 미 런던(Drive Me London)’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차 100대를 2년간 일반 도로 위에서 시험 운행하는 프로젝트다. 볼보는 “영국에서 최고로 야심 찬 자율주행 시험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이 소식에 흥분한 나는 ‘로봇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트래펄가 광장을 돌아다니는 꿈’을 꾸며 볼보에 응모했다. 그러나 ‘드라이브 미 런던’은 런던 시내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란 응답을 듣고 환상을 깨야 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즉각 인간이 운전하는 수동 모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차의 기술 수준이 아직 멀었음을 보여준다.
고속도로 운전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가장 쉬운 대상이다. 모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속도도 비슷하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가능성도 없다. 요즘 ‘자동주행’이라고 선전하는 대부분은 ‘오토 크루즈 컨트롤(정속주행)’ 기능을 발전시킨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조차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량은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상황을 가정한다(예외가 있다면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구글 자동차뿐이다). 이럴 경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가 인간의 판단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의 눈은 도로에 집중하는 대신 낮잠을 자느라 감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문제는 이뿐 아니다. 고속도로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이 힘든 게 시내 도로 주행이다. 예고 없이 도로에 파인 구멍을 자율주행 차량은 피해 가기 어렵다. 비가 쏟아지는 날,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맨해튼 거리를 무인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지 입증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고속도로에서부터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그 어떤 것도 자율운전 차량은 안전운행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증명하지 못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슬픈 현실이다. 실리콘밸리가 자랑하는 ‘운전대가 필요 없는 차’는 아직 인류의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예측한 업체는 구글이다. 구글은 늦어도 2020년 말까지는 자체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을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암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운행 중 버스와 충돌하는 첫 사고를 일으켰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구글은 계획을 급변경해야 했다. 크리스 엄슨 구글 프로젝트 총괄에 따르면 구글은 운전자가 원하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차량을 30년 뒤에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기술발달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라면 ‘30년 뒤’라는 말은 ‘실현 불가’와 동의어임을 금방 알아챌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을 염원하는 얼리어답터들은 자동차 업체들이 내놓는 시간표보다는 훨씬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기가 지루하다면 지금 당장 차에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즐겨보는 게 어떨까.
리 고메스 과학기술 저널리스트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일보] 인공지능의 학습법 (0) | 2016.08.04 |
|---|---|
| [중앙일보] 폭탄 로봇 (0) | 2016.07.19 |
| [사이언스타임즈] 바퀴벌레 로봇 (0) | 2016.07.18 |
| [중앙일보] 아이언맨 슈트-웨어러블 로봇 (0) | 2016.07.07 |
| [사이언스타임즈] 인공지능 (0) | 2016.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