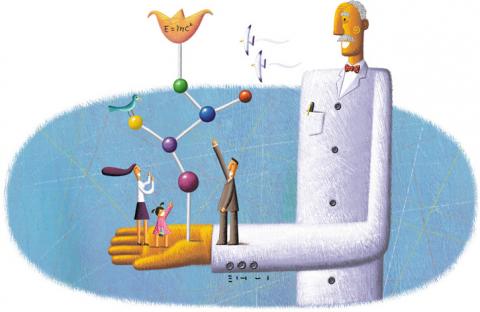기초과학이 중요한 이유
과학(Science)의 올바른 이해
최근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과학 특히 기술은 20세기 후반 10년 동안 발전 속도가 총량적으로 전반기 90년의 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100년이면 총량적으로 지금의 1,000배가 된다는 이야기다.
마이크로칩 집적도가 2년마다 2배씩 증가하여 앞으로 20년이면 1,000배가 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Moore’s Law 지금은 18개월 마다 2배)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면 무엇이든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과연 그러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오늘의 과학기술 문명을 일으킨 뿌리인 과학은 그 자체가 인간 삶의 편의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문화적 특성이 강하다.
영어와 불어인 ‘science’는 본디 <지식>이라는 뜻의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 되었다. 독일어로 과학을 ‘Wissenschaft(學問)’라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science’를 ‘과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오역(誤譯)을 그대로 받아들인데 있다. 일본이 ‘science’를 かがく(科学)라 한 것은 메이지 유신(明治 維新) 초기의 일로, 19C 후반 유럽에서는 여러 개별 학문 영역이 독립, 전문화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를 보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과학에 대한 오해는 용어의 문제 못지않게 우리의 인식(認識) 체계에도 자리 잡고 있다. 과학이라고 하면 실험을 통해 입증된 부정할 수 없는 진리(眞理)인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이는 과학적(scientific)이라 말한다. 연역(演繹)과 귀납(歸納)의 논리학(論理學)을 바탕으로 관찰-이론-실험-재현을 실현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 지나지 않다. 과학적이란 의미가 인간의 지적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년)가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란 천동설(geocentric theory)을 주장하고 로마 철학자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aeus AD 100-170년)가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이 나열되어 회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별들이 고정된 채로 있다고 하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지구 중심설(천동설)을 구체화하자 이 이론이 중세까지 과학적 해석으로 믿어왔다. 그래서 이를 종교가 받아들여 이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 화형(火刑)에 처했다.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와 이태리 천문학자 갈릴레오(Galileo Galilei 1564-1642)에 의해 지동설(heliocentric theory)이 제기되고 뉴튼(Sir Isaac Newton 1642-1727)은 중력(gravity)이론으로 땅(地上)과 하늘(天上)의 운행법칙을 통일했다. 뉴턴 역학(Newtonian mechanics)은 19C 말까지 그 근본원리가 모든 역학(力學)현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19C 이전까지 우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靜的) 우주론을 철석같이 믿어왔다.
이것이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의 상대성이론으로 산산이 깨졌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빛 보다 빠른 것은 없다. *질량은 곧 에너지(E = M x C²)이다. *빛과 공간은 중력에 의해 휜다. *시간은 속도와 중력이 클수록 느리게 간다. *세계는 3차원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했다.
20세기 들어 원자·분자 현상이 분명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용범위도 제한되어 물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경우 상대성이론을,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mechanics)을 적용하게 되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기이하기 짝이 없다.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개를 동시에 갖는다. 그랬다가 관측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양자 중첩(superposition)이다. 실제로 실험을 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 이중성 가운데 한 개 성질만을 보인다. 두 개를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실험은 디자인 할 수 없다.
덴마크 이론물리학자 보어(Bohr, Niels Henrik David 1885-1962년)가 이야기한 상보성(Complementarity)이다. 양자 얽힘(entanglement)은 더욱 기이한 현상이다. 물리계가 서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쪽 상태도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 기이한 현상은 아인슈타인도 끝까지 부정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입증 됐다.
이들 기이한 현상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관념(idea)의 세계로부터 원리를 밝혀낸 것이 아니고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코펜하겐 해석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 같이 인식체계의 대전환(Paradigm shift)이 인간의 지적 수준에 따라 바뀌어 왔고 인류문화도 이에 따라 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자역학은 나아가 우리의 세상이 4차원이 아닌 11차원(Stephen W. Hawking 1942~)이며 단일 우주가 아닌 다중우주이고 물질의 기본도 현재 확립된 표준모형이 아닌 초끈(superstring)일 것이란 화두(話頭)를 던졌다. 인식체계의 대전환은 앞으로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이로해서 기술뿐 아니라 인류문화 발전이 또 한 단계 뛰어 오를 것이다. 한마디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 이광영 과학평론가
- 저작권자 2017.12.08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