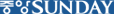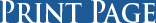|
체제나 경제 문제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한국에 와서 가장 꼴불견이 뭐였느냐’고 물어봤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20대 A씨는 “여자들이 목욕탕에서 벌거숭이로 거침없이 걸어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때 미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운 모습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덧붙였다. 50대 B씨는 “남자들이 아이를 안고 보따리를 메고, 여자가 뒤에서 핸드백 하나 달랑 들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소한 일상사이지만 남과 북의 아줌마들 사이에 쳐진 인식의 벽이다.
독일 통일 후 생긴 유행어 ‘오시(Ossi)’ ‘베시(Wessi)’가 떠올랐다. ‘게으르고 불평만 하는 동독인’(오시), ‘돈 좀 있다고 잘난 체하는 서독인’(베시)으로 서로를 비아냥대는 게 16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가 10월 현재 1만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도 여럿 생겼다.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탈북자가 힘겨워하고 있다. 초·중·고교에 다니다 중도 탈락하는 탈북 청소년도 10%나 된다.
한 탈북자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보다 같은 동포인 우리를 더 싸늘하게 본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탈북자’란 단어 자체의 언급을 피해 온 정부의 손길은 너무나 멀다. 지역 감정과 편견이 사회 운영의 부정적 ‘동력’이 돼 온 한국사회의 심리 구조로 볼 때 남북이 통일되면 동서독보다 더한 정서의 벽이 생길 것이란 주장도 있다.
탈북자 사회는 통일의 모판이 될 수도 있다. 일부 학자는 남과 북을 다 아는 탈북자 엘리트를 잘 키워서 북한의 회복을 지도하게 하자고 주장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탈북자 문제는 향후 남북 통합이 가능한지, 물과 기름 같은 남북 주민이 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험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통일 모판은 또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하는 개성공단이다. 3만4000명 북한 주민이 한국 기업의 지도 아래 제한적이나마 남한 사회를 보고 있다. 개성 인구는 35만. 노약자·어린이를 제외하면 경제 활동 가능 인구 5~6명 가운데 1명이 공단에서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얼마 전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측 인사는 “집에 젊은 여자가 있으면 모두 공단에서 일한다”고 했다. 러시아 출신 역사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025년 삼성전자에서 일할 북한 근로자를 2008년부터 교육시켜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이 제기되자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 담론이 우리 사회를 휘몰아쳤다. ‘급변 사태가 한순간 닥칠 수 있다’는 한반도의 실존적 상황도 분명해졌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치밀한 외교 전략을 짜고 있다고 믿고 싶다. ‘김 위원장이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상태’란 식의 황당한 중계방송은 더 이상 하지 말고 한반도판 ‘오시’ ‘베시’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 통합의 문제에도 차분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는 핵 문제의 전망과 상관없이, 이전 정부가 해놓은 일이냐 아니냐와도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