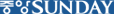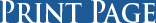|
2005년 ‘왕의 남자’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후 ‘자기 하고 싶은 영화’를 세 편이나 찍은 팔자 좋은 감독이로구나 생각할 법도 하지만 퇴물 록 가수가 라디오 DJ로 재기하는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스타’도 꽤 성공했고, 40대 직장인들이 밴드를 결성하는 이야기 ‘즐거운 인생’은 뮤지션으로 분한 배우들의 신나는 라이브 장면과 사운드트랙 ‘터질거야’ 등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어쨌든 이 영화들은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인데, 그보다는 ‘드라마도 보고 쇼도 보고’에 더 가깝다. 이번에 개봉한 ‘님은 먼곳에’ 역시 베트남전이 소재라 슬픈 드라마가 기본 줄거리지만 실제 영화를 주름잡는 것은 흥겨운 버라이어티 쇼 장면들이다.
소란스러운 관람 매너가 허락된다면 웃고 떠들고 손뼉 치고 노래를 따라 불러 가며 보고 싶은, 보아야 할 영화다. 여주인공인 수애가 한국군을 찾아가 벌이는 위문공연마다 뿜어 나오는 열화 같은 호응과 감동의 물결은 ‘전국노래자랑’이나 ‘우정의 무대’를 연상시킨다.
수애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베트남전에 참전한 남편을 찾으러 위문공연단에 들어간다. 영화 ‘님은 먼 곳에’는 시골 아낙에서 위문공연단 가수로 변모하는 한 여인, 즉 수애의 눈으로 70년대라는 시대의 아픔을 담아 낸다. 어쩌면 그녀가 베트남에 간 진짜 이유는 남편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서, 그것으로 관객(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전을 통해 우리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수애가 무대 의상을 잃어버리자 매니저인 정진영은 주변에 널린 군복을 가지고 임시변통 섹시 핫팬츠를 만들어 낸다. 이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영화 만듦새는 조금 허술하다. 제작자로도 일하며 충무로에서 잔뼈가 굵은, 짠돌이로 소문난 감독의 근검·절약 스타일 탓(덕)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촌스러운 형식은 저개발 시대를 담아 내는 데 썩 잘 어울린다. 그가 “영화는 감독만의 예술이 아니라 (축구와 같은) 패스의 예술”이라고 누차 강조한다는 점도 상기해야겠다.
대체로 386세대와 겹치는 7080세대에게 왠지 개인의 ‘끼’라든가 ‘예술적 천재성’ 같은 단어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으� 으�’ 하는 ‘공동체적 감수성’이 세대를 대표하는 특징인 듯 보인다. 또한 낯간지러운 연애 감정보다는 우정이라든지 가족애 같은 것이 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터다.
그동안 이준익의 영화들 역시 남성 간의 우정과 연대에 집중하며 여성 캐릭터나 사랑 이야기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베트남까지 남편을 찾아가는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영화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여자가 왔다는 건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모성애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보다 깊고 넓은 테두리에서의 사랑”을 말한다.
이준익 감독은 이런 공동체적 애정과 소통에의 욕망을 음악을 이용해 표현한다. 그 음악들에는 7080세대 문화적 욕망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수애가 부르는 노래 ‘님은 먼 곳에’는 심지어 베트공마저 감화시킨다. “소통을 위해 사람들은 거리로, 혹은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음악과 연주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끄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은연중에 영화 속에 자꾸 음악을 넣게 된 것 같다”고 이 감독은 털어놓는다.
7080세대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흑백 TV를 보던 옛 시절과 각자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나 PMP를 즐기는 요즘 사이에 ‘낀 세대’이면서 모종의 공동체 공간에서 음악을 함께 즐기고 음악에 감성과 함께 이상도 담았던 마지막 세대다. 1959년생 이준익 감독은 그 세대의 대표주자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