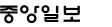[삶의 향기] 과학과 행복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
[중앙일보] 입력 2015.11.14 00:46 수정 2015.11.14 00:55

김환영
논설위원
과학과 행복은 어떤 사이일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각기 제 갈길 찾아 나설 수 있지만, 과학과 행복은 ‘이별 불가’다. 17세기 과학혁명 이래 과학과 행복은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한다. 물론 과학 약소국의 국민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선진국·중진국·후진국들이 형성하는 ‘국가들이 모이를 쪼아먹는 순서(international pecking order)’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글로벌 중견국가가 돼버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이 개인의 행복을 좌우한다. 인문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과학의 사고와 재능을 사회가 요구한다. 경제 강국이건 군사 강국이건 과학 강국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보다는 국가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강해야 개인도 행복하다.
x와 y 사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물론 많다. 하지만 뭔가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수와 영이’가 사랑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오다가다 눈이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파나 ‘소개팅 주선자’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과학과 행복 사이에 끼어들어 과학이 행복을 낳고 행복이 과학을 낳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뭐니 뭐니 해도 정부다. 촉새는 불필요하게 끼어들어 일을 망친다. 반면 촉매는 안 될 일도 되게 한다. 정부는 과학과 행복 사이에서 촉매가 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로 시작해 우리나라의 정부들은 많은 촉매 기능을 했다. 우리 정부들은 공산주의를 저지했고 산업 입국을 이뤘으며 민주화를 심화시켰다. 무(無)에서 유(有)로, 없던 산업 분야를 창조한 것도 정부다. 남은 프런티어는 과학이다.
다음번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모토·슬로건·공약으로 내놔야 한다. 경제민주화·근대화·문민·복지·실용주의·참여민주주의·창조경제 등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지만 본격적·핵심적·전면적으로는 제기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내세울 만한 테마가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 입국’이다. 일자리 문제이건 고령화 문제이건 핵심은 과학이기 때문이다.
70년 넘게 끌고 있는 민족적 과제인 민족 통일마저도 과학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서 ‘삶의 향기’가 나려면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과학 진흥이 필요하다.
과학 입국의 역사는 이미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됐다. 대통령 이승만은 1958년 10월 28일 원자력 연구를 지시했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 과학에 힘쓰지 않은 정부는 없다. 현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그중 눈길이 가는 것은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이 펴낸 『미래한국보고서』다. 이런저런 미래학 문헌이 있지만 이 책은 외국이 아니라 우리 입장, 개인이 아니라 정부 공식 기관이 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미래 세상의 10가지 핵심 트렌드’를 짚어낸 이 책의 중심에는 물론 과학이 있다. 제1장 ‘기술과 사회의 충돌, 공존을 모색하다’부터 쭉 읽다 보면 희망과 불안이 사이클을 이루며 교차한다. 삶의 향기 같은 여유를 따지기엔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로봇과 기계의 발전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직업 외에는 모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내로 수십억 명이 실업자가 된다. 그중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다. 다행히 마지막 제10장은 ‘과학기술이 가져올 통일의 장밋빛 미래’다. 삶의 향기의 가능성이 복원된다.
과학과 행복 사이에 정부만 들어가면 안 된다. 개인도 들어가야 한다. 과학을 사랑하며, 과학에 친숙한 개인, 과학적 사고로 삶의 향기를 지키는 개인이 필요하다.
김환영 논설위원
'내가 보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앙일보] 나이 든 사람에게 경배를 (0) | 2015.12.09 |
|---|---|
| [중앙일보] 창의력-곰팡이로 색깔을 나타낸 미술작품 (0) | 2015.11.19 |
| [사이언스 타임즈] 아내에게 가사도우미 로봇 선물 (0) | 2015.11.10 |
| [,사이언스타임즈] 2015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 '가지타 다카아키' (0) | 2015.10.17 |
| [tkdldjstmxkdlawm] 영화 ‘마션’의 거짓과 진실 (0) | 2015.10.15 |